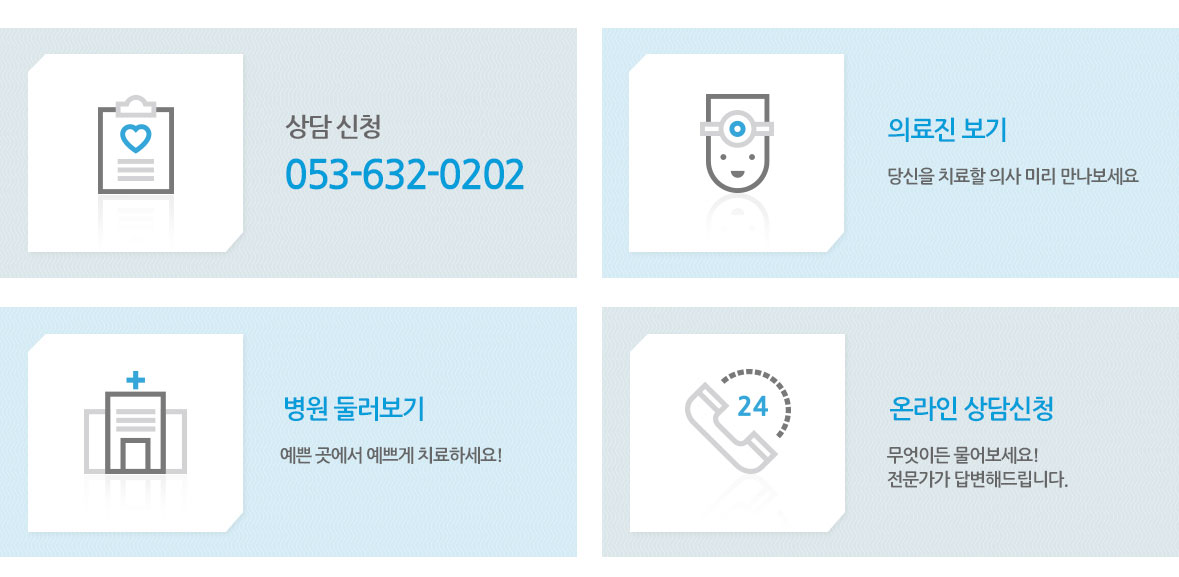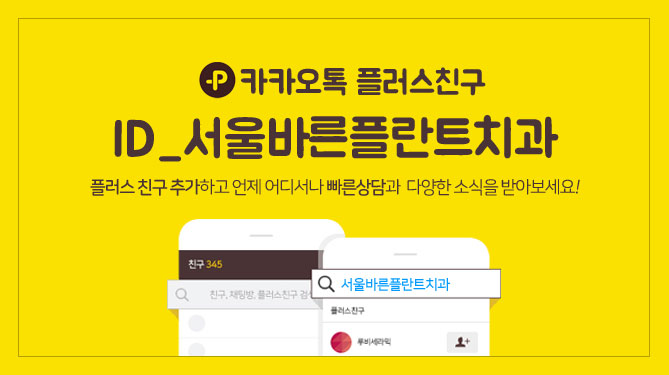지워지지 않는 우정
文奉志洪
4
1070
2020.11.26 14:59
위 작품을 보내주신 길벗님 감사합니다.
작품은 소설 내용과 상관없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안녕이라고 말 하지 마. <**연재소설**>
지은이 : 서울바른플란트 (文奉志洪)
제 79 화 : 지워지지 않는 우정
작은 불씨가 모든 것을 태우는 무서운 화마의 근본이라면,
오늘이 있기까지 장우를 지배한 근원은 소망이었다.
소망의 첫인상과 첫 인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순수하고 맑았기 때문이다
망설이던 장우가 “소망아 네가 멀리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보다 네가 더 두려워 ”
“‘언젠가 고백했듯이 나를 지배한 네가 있었기에
내 존재에 의미가 있는 거야”
<장우는 마음의 고백을 하려하는데...>
엄마는 방에서 기척이 없자,
노크하고 문을 열고는 고열에 시달리던 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혹시나 아파 병원을 찾았나 하는 생각에 H대 응급실로 전화하고,
친구들에게 전화로 소망이 행방을 묻다 애가 타는 심정을 진정시키지 못 한 채
기사를 앞세우고 가정부 아줌마와 무작정 골목을 누비고 다니다
희미한 조명아래 앉아 있는 장우와 소망을 발견하고는 문을 열었다.
(순대국 아줌마가 놀라 반색하며)
“아니 사모님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소망과 장우가 동시에 쳐다보고는 일어난다.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장우가 정중히 인사를 한다)
“그래 장우구나, 소망이 하고 같이 유학 간다고?”
(소망이 아직 장우가 떠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소망이 많이 아파서 집으로 데려 가야겠다.”
“아줌마한테 말하고 나오면 이런 소란 안 피잖아/
아빠 걱정하시겠다. “
“엄마 나 5분만 있다가 들어갈게요.”
“알았다. 장우야 소망이 쉬어야 하니 5분 있다 집으로 보내라 /”
“네 어머니 걱정마세요 그럼 들어가십시오.”
교양이 넘치는 고운 자태의 어머니가
조용히 문을 여닫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장우가 의자를 당겨 소망의 이마에 손을 대고는
그럴 줄 알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다.
“열이 있잖아, 많이 아팠구나/
내 짐작이 맞았구나./ 내가 항상 널 아프게 하는 구나.“
소망이 손을 뻗어 장우의 입을 틀어막고는
“아픔을 대신 하는 것 보다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었어”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준다는 그런 흔한 대사 말고,
진정 나를 알 수 있는 그 무엇을 ...“
넌 내 마음을 ...
소망이 얼굴을 붉히며 말을 맺지 못 하고는
의자에서 일어나 나가자 장우가 총총히 따라가 나란히 걷는다.
<아무 말도 못 하고...>
<사랑이란 글 한자 못 전하고...>
말없이 소망이 집안으로 들어가자
장우는 터덜터덜 걸어 자신의 공간으로 향한다.
누구를 위해 주머니를 털어서 적선 한 적도 없고,
마음이 동해 봉사활동 한번 하지 않았다.
두들겨 부수고, 때리며 맞은 적은 있어도,
지극히 참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한번 해 본적이 없다.
어려서 부모와 놀던 기억을 빼고는 친척이 모여도
늘 혼자 운동을 하러 나가거나 자신의 방에서 책과 씨름만 했다.
아빠는 친척이 없으신데 비해 엄마는 7남매에 장녀다.
이모와 외삼촌이 명절에 바리바리 선물을 사들고 방문을 하시면,
장우는 슬그머니 일어나 PC방으로 피하곤 했다.
외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도 장우는 인사만 드리면
그 자리를 떠나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다
외로움을 달랜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 하는 것을 즐겼다.
오토바이족들은 대화가 필요 없었다.
서로 눈빛을 보고 <부릉부릉> 소리를 내다가
마음이 맞으면 일직선을 굉음과 함께 질주하여 승부를 가렸다.
패하면 승복하고 미련 없이 인사를 나누고
내일의 기약도 없이 갈라서서 자신의 길만
응시하고 또 다른 고독의 질주를 한다.
장우는 한동안 그렇게 길들여졌었다.
그런 장우가 혼자가 아니고 소망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달리는 횟수가 늘어만 갔다.
그러나 오토바이 특성상 타는 동안에는 거의 대화를 하지 못 한다.
어둠을 가르고 모든 바퀴를 수용하는 도로를
두 사람이 같이 해도 장우의 고독은 소망과 대화하고
풀기에는 너무나 깊고 어두웠다.
혼자 도로를 내달리며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 옆 잔디에 앉아 푸른창공 아래 맴도는
팔당댐을 내려다보는 장우에게는 항상 작열하는 태양만 있었다.
더위에 땀이 흘러도 5분의 여유를 담기위해 아랑곳 하지 않고
뜨거운 태양과 맞섰고,
살을 도려내는 듯 불어오는 강바람을 맞으며
메마른 잔디에 몸 한쪽을 대고앉아 처절하게 태양과 대적하곤 했다.
바람과 맞서고 ,태양과 싸우고,
더위도 이기고, 추위도 극복하고, 그런 장우에게는 잠시도
쉬지 않고 투덜거리는 오토바이와 아무 말 없는 헬멧이 있었다.
소망은 강요하지도 않고, 무섭다고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와선 작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듣기만 하다 가곤 한다.
소망은 즐기지도 않지만 싫다고 외면하지 않고,
오토바이가 달리는 똑 같은 방향을 따르기를 좋아한다.
하고 싶은 말이 산처럼 많은데, 흐르는 강처럼 유유히 기다리며,
여느새 장우의 작은 등에 시샘하는 바람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다.
집에 가까이 올수록 사무치는 외로움에 등골이 오싹하고,
몸속 따뜻한 심장이 그리움에 떨어 빨라지자,
두 손이 유혹하듯 귀를 막고, 추위에 얼은 작은 입술이 아주 낮게
“소망아, 소망아 네가 나의 분신이야“ 라고 말한다.
작품은 소설 내용과 상관없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안녕이라고 말 하지 마. <**연재소설**>
지은이 : 서울바른플란트 (文奉志洪)
제 79 화 : 지워지지 않는 우정
작은 불씨가 모든 것을 태우는 무서운 화마의 근본이라면,
오늘이 있기까지 장우를 지배한 근원은 소망이었다.
소망의 첫인상과 첫 인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순수하고 맑았기 때문이다
망설이던 장우가 “소망아 네가 멀리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보다 네가 더 두려워 ”
“‘언젠가 고백했듯이 나를 지배한 네가 있었기에
내 존재에 의미가 있는 거야”
<장우는 마음의 고백을 하려하는데...>
엄마는 방에서 기척이 없자,
노크하고 문을 열고는 고열에 시달리던 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혹시나 아파 병원을 찾았나 하는 생각에 H대 응급실로 전화하고,
친구들에게 전화로 소망이 행방을 묻다 애가 타는 심정을 진정시키지 못 한 채
기사를 앞세우고 가정부 아줌마와 무작정 골목을 누비고 다니다
희미한 조명아래 앉아 있는 장우와 소망을 발견하고는 문을 열었다.
(순대국 아줌마가 놀라 반색하며)
“아니 사모님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소망과 장우가 동시에 쳐다보고는 일어난다.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장우가 정중히 인사를 한다)
“그래 장우구나, 소망이 하고 같이 유학 간다고?”
(소망이 아직 장우가 떠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소망이 많이 아파서 집으로 데려 가야겠다.”
“아줌마한테 말하고 나오면 이런 소란 안 피잖아/
아빠 걱정하시겠다. “
“엄마 나 5분만 있다가 들어갈게요.”
“알았다. 장우야 소망이 쉬어야 하니 5분 있다 집으로 보내라 /”
“네 어머니 걱정마세요 그럼 들어가십시오.”
교양이 넘치는 고운 자태의 어머니가
조용히 문을 여닫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장우가 의자를 당겨 소망의 이마에 손을 대고는
그럴 줄 알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다.
“열이 있잖아, 많이 아팠구나/
내 짐작이 맞았구나./ 내가 항상 널 아프게 하는 구나.“
소망이 손을 뻗어 장우의 입을 틀어막고는
“아픔을 대신 하는 것 보다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었어”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준다는 그런 흔한 대사 말고,
진정 나를 알 수 있는 그 무엇을 ...“
넌 내 마음을 ...
소망이 얼굴을 붉히며 말을 맺지 못 하고는
의자에서 일어나 나가자 장우가 총총히 따라가 나란히 걷는다.
<아무 말도 못 하고...>
<사랑이란 글 한자 못 전하고...>
말없이 소망이 집안으로 들어가자
장우는 터덜터덜 걸어 자신의 공간으로 향한다.
누구를 위해 주머니를 털어서 적선 한 적도 없고,
마음이 동해 봉사활동 한번 하지 않았다.
두들겨 부수고, 때리며 맞은 적은 있어도,
지극히 참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한번 해 본적이 없다.
어려서 부모와 놀던 기억을 빼고는 친척이 모여도
늘 혼자 운동을 하러 나가거나 자신의 방에서 책과 씨름만 했다.
아빠는 친척이 없으신데 비해 엄마는 7남매에 장녀다.
이모와 외삼촌이 명절에 바리바리 선물을 사들고 방문을 하시면,
장우는 슬그머니 일어나 PC방으로 피하곤 했다.
외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도 장우는 인사만 드리면
그 자리를 떠나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다
외로움을 달랜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 하는 것을 즐겼다.
오토바이족들은 대화가 필요 없었다.
서로 눈빛을 보고 <부릉부릉> 소리를 내다가
마음이 맞으면 일직선을 굉음과 함께 질주하여 승부를 가렸다.
패하면 승복하고 미련 없이 인사를 나누고
내일의 기약도 없이 갈라서서 자신의 길만
응시하고 또 다른 고독의 질주를 한다.
장우는 한동안 그렇게 길들여졌었다.
그런 장우가 혼자가 아니고 소망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달리는 횟수가 늘어만 갔다.
그러나 오토바이 특성상 타는 동안에는 거의 대화를 하지 못 한다.
어둠을 가르고 모든 바퀴를 수용하는 도로를
두 사람이 같이 해도 장우의 고독은 소망과 대화하고
풀기에는 너무나 깊고 어두웠다.
혼자 도로를 내달리며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 옆 잔디에 앉아 푸른창공 아래 맴도는
팔당댐을 내려다보는 장우에게는 항상 작열하는 태양만 있었다.
더위에 땀이 흘러도 5분의 여유를 담기위해 아랑곳 하지 않고
뜨거운 태양과 맞섰고,
살을 도려내는 듯 불어오는 강바람을 맞으며
메마른 잔디에 몸 한쪽을 대고앉아 처절하게 태양과 대적하곤 했다.
바람과 맞서고 ,태양과 싸우고,
더위도 이기고, 추위도 극복하고, 그런 장우에게는 잠시도
쉬지 않고 투덜거리는 오토바이와 아무 말 없는 헬멧이 있었다.
소망은 강요하지도 않고, 무섭다고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와선 작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듣기만 하다 가곤 한다.
소망은 즐기지도 않지만 싫다고 외면하지 않고,
오토바이가 달리는 똑 같은 방향을 따르기를 좋아한다.
하고 싶은 말이 산처럼 많은데, 흐르는 강처럼 유유히 기다리며,
여느새 장우의 작은 등에 시샘하는 바람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다.
집에 가까이 올수록 사무치는 외로움에 등골이 오싹하고,
몸속 따뜻한 심장이 그리움에 떨어 빨라지자,
두 손이 유혹하듯 귀를 막고, 추위에 얼은 작은 입술이 아주 낮게
“소망아, 소망아 네가 나의 분신이야“ 라고 말한다.